배려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다
백순심 작가
글. 박성혜 + 사진. 김정호
제 아름다움을 뽐내기 여념 없던 봄꽃 열전의 기운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초록의 물결로 넘실대는 초여름, 하늘이 내린 인제로 향했다. 인제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온통 싱그러움으로 가득했고 연둣빛 초록빛으로 둘러싸인 산세는 강원도의 멋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도착한 인제의 한 카페에서 백순심 작가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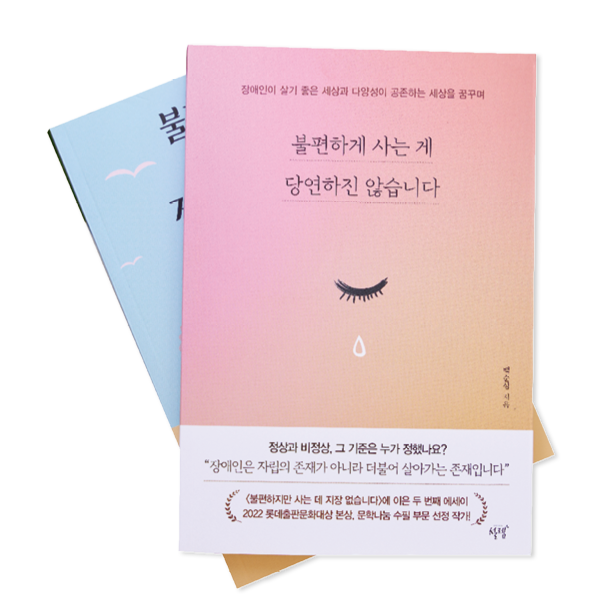
불편하지만, 불편하게
그는 《불편하지만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하진 않습니다》를 출간한 작가이면서 20년 차 사회복지사이다. 출간한 책 제목에 등장하는 ‘불편하지만’, ‘불편하게’라는 표현에서 ‘어떤 불편을 겪었을까?’하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그에게 ‘불편’이란 어떤 것일까.
부산에서 인제까지 취업의 길
그가 생활하는 인제군은 강원도 영서 북부지역이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에서 대중교통으로 족히 5시간이나 걸리는, 그것도 몇 번 환승을 통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터를 잡게 된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친구들처럼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문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두드려도 두드려도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부산부터 시작해 점점 지역 반경을 넓혀가며 서류를 넣었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출근하세요’라고 말해준 곳은 없었다. 그의 능력을 보고 문을 열어준 곳이 바로 인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이다. 그렇게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이 벌써 20년 전이다.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건 7살 때 유치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회 적응을 못 할 수 있겠구나’, ‘살면서 차별받을 일이 많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이 제게 하는 말이나 행동보다 어른들이 던진 말이 더 큰 상처였답니다. ‘네가 장애인이니 참고, 이해해야 해!’라고만 했거든요. 그 때문에 비장애인처럼 보이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불편, 당연한 것일까요?
책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시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나는 비장애인의 기준에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맞춰 살아온 시간이 버겁고 외로웠다.’ 이 문장 앞에 페이지를 쉽게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멈췄다.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지만, 뇌병변장애인이 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직업은 없었다. 고민 끝에 찾은 것이 사회복지사이다. 취업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나도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다채롭고 다양한 기준이 있다면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 어디에도 장애인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건 쉽게 보이지 않는다.
“사회 구조의 기준값이 비장애인 범주에 속한 이들에게 맞춰 있는 거 아닐까요? 사회적인 인식, 문화, 편견, 환경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만듭니다. 장애인이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대학 시절 필기, 리포트를 비롯한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혔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를 잡아준 건 선배의 한마디다. ‘네가 포기하면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포기할 거야.’ 그길로 학생지원처를 찾아갔다. 학교에 ‘장애인 도우미 학생지원’을 요청했다. 제도는 있지만 장식뿐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두드렸다. 그렇게 1학년 2학기 때부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자신 앞에 놓인 벽을 조금씩 무너트렸다. “졸업식 날 학생지원처 담당자가 저한테 ‘수고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참 많이 괴롭혔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울컥했어요.”
결혼하고 출산하며 또 한 번 벽에 부딪혔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비장애인과 달리 뇌병변장애인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았다. 이유식을 만드는 것도 약 먹이는 일도 쉽지 않았다. 도우미에게 부탁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움츠러들게 됐다. 죄인이 아닌데 마치 죄인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장애를 인정하게 된 글쓰기
“출판사 편집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쓰기는 곧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나의 정체성은 결국 장애인인 셈이잖아요. 그게 계기가 되었어요. 더 이상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렇게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40년이 걸렸다.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업무량도 만만치 않을 텐데 글쓰기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장애 현장에서 근무하며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정리했다. 그렇게 쓴 이야기를 모아 출판사 문을 두드렸다. 일주일간 수도 없이 투고 메일을 보냈다.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다. 꼭 한 곳에서는 연락이 올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그 믿음으로 두 권의 책을 출간했고, 《불편하지만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책은 2022년 롯데출판문화대상에서 본상 수상 등의 성과를 냈다.
20년 차 사회복지사이지만, 출간 이후 장애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아졌다는 그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동시에 세 번째 책 집필 중이라며 ‘엄마가 된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계획을 살짝 들려줬다.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존중
“장애인에게 최고의 존중은 바로 장애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라는 그는 마지막으로 <디딤돌> 독자에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등이요.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들에게 이해를 바라지 말고, 비장애인 또한 장애인을 어렵고 무서운 존재로 바라보지 말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친구로 생각해주세요.”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다름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 그 사회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필요할 때이다.
